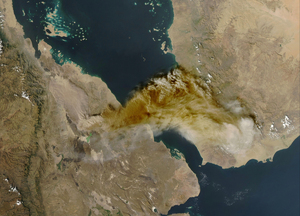2000년대 대형 컨테이너선 등 수주
IMO 규제 맞춰 기술력 확보 주력
해양 플랜트 사업도 대거 확장 한몫
1970년대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가 설립됐을 때만 해도 한국은 자체 기술, 기반 시설, 전문 인력이 거의 없는 조선 후진국이었다.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의 거대 군함은 두 나라의 격차를 보여주는 신문물이었다.
50년이 흐른 지금은 한국 기업이 일본을 제친 데 이어 중국의 맹추격에도 세계를 주름잡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 해군 함정을 한국 기업이 건조하는 미국발 수주도 곧 현실화할 예정이다.

1970년대 조선사들은 중화학 공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값싸고 품질 좋은 소형 선박을 주로 생산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과 비교적 건조한 기후, 납기를 반드시 지키는 국민성은 조선업 발달에 유리한 요소였다.
25일 조선 3사에 따르면 1980∼1990년대까진 유조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수주가 주를 이뤘다. 당시 세계 시장의 강자는 일본 기업들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 침체 속 공급 과잉으로 저가 경쟁이 심해진 가운데, 일본 기업들은 수요가 적은 고품질·고부가가치 선종에 집중하며 한·중 기업에 밀리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 한국 기업들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수주하기 시작했고, 2010년 이후 본격화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에 맞춰 단가가 높은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등에 집중하며 기술력 확보에 나섰다. 방산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HD현대, 한화오션과 달리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FLNG) 사업도 대거 확장했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10년에 걸친 조선 경기 불황은 한국 기업에 위기로 작용했다. 2010년대 중반 구조조정 바람이 불며 1만명이 넘는 인력이 3사를 떠났고, 숙련공 일부가 밥벌이를 위해 중국으로 넘어간 건 한국 조선업계의 뼈아픈 대목으로 남았다. 업계 관계자는 “그때는 조선·해양 부문을 제외한 계열사도 다 팔았다”며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이 보유한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종에 대한 경쟁력은 다시 돌아온 조선업 호황을 맞아 빛을 보고 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절충한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은 하이브리드 ‘이중연료’ 선박 시장은 현재 한국 조선 3사가 주도하고 있다.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한 데 이어 상선, 특수선, FLNG 등 분야별 수주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수년간 전망도 밝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주도권이 넘어왔고 그걸 중국이 위협하는 가운데 인도도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국군 포로 기억의 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6/128/20251126519766.jpg
)
![[세계포럼] 강성 지지층에 포획된 정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5/128/20251015518693.jpg
)
![[세계타워] ‘제국’의 긴 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8/128/20250618518838.jpg
)
![[기고] 학교 폭력,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6/128/202511265184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