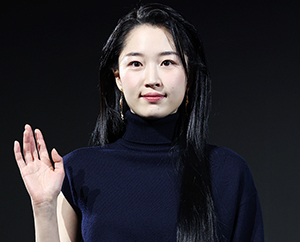‘국기문란죄’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기자는 2014년 ‘정윤회 문건 사태’ 때 그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있다. 당시 기자는 이른바 ‘문건’을 폭로한 팀의 막내였다. 기사가 나가자 검찰이 서둘렀다. 기자들을 명예훼손죄의 피의자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선배들이 책임지고 구속될 테니 너는 선배 탓이라고만 말하라”며 어깨를 두드리는 선배 두 분을 뒤로하고 서울중앙지검 영상녹화조사실에 들어갔다. 실제로 한 게 없어서 별로 할 말도 없었다. 출근해서 화분에 물 주고, 서류 복사하고, 선배들이 술 먹자고 하면 같이 마셔준 게 전부였다.
조사실 문을 열었더니 뜻밖의 검사가 있었다.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니라 시국 사건을 맡은 공안부 검사가 기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고 역정을 낸 게 머리를 스쳤다.

‘난 공안사범이구나.’ 권력의 힘은 사태를 이름 짓고 그럴듯한 사실을 창출하는 데 있다는 걸 실감했다. 국기문란죄는 그런 것이었다.
몇 년 전 얘기를 꺼낸 건 기시감이 드는 일이 벌어져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 말이다. 경찰이 일부러 윤 대통령 결재 이전에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는지, 아니면 관행을 따르다가 벌어진 우발적 사고인지 기자는 알지 못한다. 일부러 그랬다면 엄중 징계할 일이고, 관행과 법제의 괴리에서 일어난 소동이라면 관행을 법으로 인도하면 될 것이다. ‘국기문란’이라고 한 걸 보면 윤 대통령의 심증은 ‘고의’에 쏠려 있는 듯하다. 실체가 어떻든 대통령의 ‘국기문란’ 인식에 맞춰 조사 결과가 나올 것임은 자명하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알고 보니 국기문란이 아니었다”고 보고서를 써낼 공무원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을까. 2014년에 검찰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부작용은 뱀의 독처럼 공무원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다. 공무원들이 ‘실세’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벌써부터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인사와 정책을 밀어붙일 만한 실세는 누구인가”라는 쓸모 있는 정보가 눈치 빠른 공무원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장관이 발표한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안을 두고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의혹에 쐐기를 박았다. 실세가 없다 해도 그런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만으로도 권력의 기반에 금이 간다.
공직사회도 얼어붙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나서서 ‘국기문란죄’라고 직접 단언하는데 어떤 간 큰 공무원이 보도자료 하나 허투루 내겠는가. 이럴 때는 복지부동이 최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 안 하는 공직자들을 답답해했다. 날이 갈수록 대통령의 말에 날이 섰고, 그럴수록 공무원들은 일손을 멈췄다. 그 와중에 입 속의 혀처럼 굴어 권력의 곁불이라도 쬐려는 자도 나오기 마련이다. 국기문란범으로 찍힌 경찰도 어수선하다. 금도를 넘어서는 일이 드러났을 때는 이미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 대부분이다. 경찰이 물고문에 죽은 대학생을 두고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가 국민들이 들고일어난 때가 그리 먼 얘기가 아니다. 경찰이 ‘내무부 치안본부’였던 시절의 일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징벌적 판다 외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6/128/20251216517712.jpg
)
![[데스크의 눈]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부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6/128/20251216517704.jpg
)
![[오늘의 시선] ‘똑부형’ 지도자가 경계해야 할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6/128/20251216517681.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나의 다크호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6/128/20251216517691.jpg
)





![[포토] 한소희-전종서 '여신들의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300/20251217500695.jpg
)